돈대미,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 작은 오름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5] 3부 오름-(74)돈대미,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 작은 오름
고대어 '탄달미'에 온 돈대미, 물이 흐르는 골짜기
- 입력 : 2025. 02.11(화) 02: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고유어는 문자 생활 이전의 언어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450번지 일대다. 표고 41.9m, 자체 높이 22m로 낮다. 둘레도 1,571m 정도로 2㎞가 채 안 되는 작은 오름이다.
산 모양이 조금 높고 평평하여 돈대(墩臺)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돈대미'라고 한 것이 '돈대'가 '돈두'로 와전되어 '돈두미'로 된 것이며, '미'는 산의 제주 방언이고, 한자 이름 '돈두(敦頭)'는 한자의 음을 빌어 표기한 것인데 '돈대'가 '돈두'로 와전된 뒤의 표기라고 한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퉁이물내' 속에 들어 있는
'돈대미' 지명의 단서
돈대(墩臺)란 사전적으로 평지보다 높직하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을 일컫는 한자 말이다. 그러므로 이 학자의 해석으로 본다면 한자어로 부르기 시작했다가 점차 고유어로 발전했다는 말이 된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모두 '돈'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돈'이란 무슨 말일까가 문제의 핵심이다. 단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주변의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곳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다. 요즘 시각으로는 골짜기나 계곡이라기보다는 큰 도랑 정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일대에는 강장이통, 개물논, 날랭이통, 논동산, 돗구못, 통비물 등 못들과 족은산물 같은 용천수가 있다. 그러니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당연히 골짜기 물이라는 지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골짜기를 이곳에서는 '통이물내' 혹은 '퉁이물내'라 한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통이물 혹은 퉁이물이 흐르는 내가 된다. 내라는 말은 제주어에서 골짜기를 지시한다. 통이물이 흐르는 내가 통이물이 된다. 이 '통이물' 혹은 '퉁이물'의 '통' 혹은 '퉁'이란 무엇일까?
이 말은 신기하게도 북방어면서 역사적으로는 고구려어다.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책에는 골짜기(谷)에 해당하는 말로 돈(頓), 탄(呑), 단(旦)을 나타내는 지명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들은 대체로 '탄'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어원상으로는 평평한 땅(평야), 저지대, 넓은 못을 가리키는 트랜스유라시아어에서 기원하여 돌궐어로 '텡아', 퉁구스어로도 거의 같은 발음으로 분화했다. 이 말은 고구려어에서 골짜기라는 말로 쓰였는데, 마을을 지시하는 말로도 의미 분화가 이루어졌다. 사실 마을이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있다. 지금도 만주에서는 마을을 '툰(屯)'이라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점차 동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일본어에서도 골짜기(谷)를 '타니'라 한다. 제주어에서도 통이물 혹은 툰이물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이처럼 골짜기를 지시하는 말로 남아있다. 마을을 지시하는 지명에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탄달미'를 한자로 어떻게?
그럼 '돈대', '돈도', '돈돌', '돈두'에서 보이는 '대', '도', '돌', '두' 등은 무슨 뜻일까? 이 말들도 모두 고유어를 한자로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것들이다. 이 말은 고유어 '돌'을 쓰려고 동원한 한자들이다. 돌은 고유어로 물을 지시한다.
퉁구스어 중 에벤키어의 '톨개', 에벤어의 '톨구'로 나타난다. 몽골어권의 칼카어 '툴게'에 대응한다. 튀르크어권의 여러 언어에선 '파도' 혹은 '파도가 치다' 같은 의미로 쓴다. 국어에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이 도랑의 의미를 갖는다. 이 渠(거)라는 한자는 도랑이라는 뜻 외에 개천의 뜻으로도 썼다. 광주본 천자문에는 '개천 거'로 나온다. '돈대', '돈도', '돈돌', '돈두'에서 보이는 '대', '도', '돌', '두' 등은 모두 물 특히 흐르는 물을 지시한다. 이 네 개 중 '돌'만이 음을 그대로 표기한 음독자가 된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돈두미오름 혹은 돈두악 등으로 부르는 이 오름을 고대인들은 '탄달미'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돈대미란 어원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 작은 오름이란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450번지 일대다. 표고 41.9m, 자체 높이 22m로 낮다. 둘레도 1,571m 정도로 2㎞가 채 안 되는 작은 오름이다.
산 모양이 조금 높고 평평하여 돈대(墩臺)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돈대미'라고 한 것이 '돈대'가 '돈두'로 와전되어 '돈두미'로 된 것이며, '미'는 산의 제주 방언이고, 한자 이름 '돈두(敦頭)'는 한자의 음을 빌어 표기한 것인데 '돈대'가 '돈두'로 와전된 뒤의 표기라고 한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1653년 탐라지 등에 돈대산(敦臺山), 1910년경 조선지지자료 돈돌악(敦乭岳), 그외 고전에 다양하게 표기했다. 지금까지 나온 지명들을 모으면 돈대산(墩臺山), 돈대산(敦臺山), 돈도미오름, 돈도악(敦道岳), 돈돌악(敦乭岳), 돈돌오름, 돈두미오름, 돈두악(敦頭岳), 돈두악(頓頭岳) 등 8개가 된다. 표기로 볼 때 가장 오랫동안 통용했던 이름은 돈대산(敦臺山, 墩臺山)이다. 어느 학자는 이 오름의 지형이 조금 높고 평평하여 돈대(墩臺)를 이루므로 돈대미라 하고, 나중에 '돈두미', '돈도미' 또는 '돈도미오름', '돈두미오름' 등으로 분화하였다고 했다. 고유어는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쓰던 언어다.
'퉁이물내' 속에 들어 있는
'돈대미' 지명의 단서
돈대(墩臺)란 사전적으로 평지보다 높직하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을 일컫는 한자 말이다. 그러므로 이 학자의 해석으로 본다면 한자어로 부르기 시작했다가 점차 고유어로 발전했다는 말이 된다.
언어의 분화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바에야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지역에서 고유어로 부르던 것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한자가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돈대(墩臺)의 원래 표기와 달리 敦(돈), 頓(돈)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대(臺)의 경우도 도(道), 돌(乭), 두(頭)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평지보다 높직하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이란 뜻의 한자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러니 위의 주장과는 역순으로 여러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돈대(墩臺)라는 단어를 동원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모두 '돈'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돈'이란 무슨 말일까가 문제의 핵심이다. 단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주변의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곳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다. 요즘 시각으로는 골짜기나 계곡이라기보다는 큰 도랑 정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일대에는 강장이통, 개물논, 날랭이통, 논동산, 돗구못, 통비물 등 못들과 족은산물 같은 용천수가 있다. 그러니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당연히 골짜기 물이라는 지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골짜기를 이곳에서는 '통이물내' 혹은 '퉁이물내'라 한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통이물 혹은 퉁이물이 흐르는 내가 된다. 내라는 말은 제주어에서 골짜기를 지시한다. 통이물이 흐르는 내가 통이물이 된다. 이 '통이물' 혹은 '퉁이물'의 '통' 혹은 '퉁'이란 무엇일까?
이 말은 신기하게도 북방어면서 역사적으로는 고구려어다.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책에는 골짜기(谷)에 해당하는 말로 돈(頓), 탄(呑), 단(旦)을 나타내는 지명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들은 대체로 '탄'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어원상으로는 평평한 땅(평야), 저지대, 넓은 못을 가리키는 트랜스유라시아어에서 기원하여 돌궐어로 '텡아', 퉁구스어로도 거의 같은 발음으로 분화했다. 이 말은 고구려어에서 골짜기라는 말로 쓰였는데, 마을을 지시하는 말로도 의미 분화가 이루어졌다. 사실 마을이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있다. 지금도 만주에서는 마을을 '툰(屯)'이라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점차 동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일본어에서도 골짜기(谷)를 '타니'라 한다. 제주어에서도 통이물 혹은 툰이물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이처럼 골짜기를 지시하는 말로 남아있다. 마을을 지시하는 지명에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탄달미'를 한자로 어떻게?
그럼 '돈대', '돈도', '돈돌', '돈두'에서 보이는 '대', '도', '돌', '두' 등은 무슨 뜻일까? 이 말들도 모두 고유어를 한자로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것들이다. 이 말은 고유어 '돌'을 쓰려고 동원한 한자들이다. 돌은 고유어로 물을 지시한다.
溝(구)라는 한자는 오늘날 '도랑 구'라 설명한다. 그러나 1576년 신증유합이라는 책에는 '돌 구'라고 한다. 도랑만이 아니라 고대 지명에서는 계곡(溪), 골짜기(谷), 강(江), 내(川)의 뜻으로도 쓰였다. 여기서 '돌'이란 말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지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渠(거)라는 한자도 오늘날 '도랑 거'라 하는데 중세에는 '돌 거'라 했다. 도랑을 16세기만 해도 '돌'이라 한 것이다. '도랑'의 조상어가 '돌'이라는 뜻이다.
퉁구스어 중 에벤키어의 '톨개', 에벤어의 '톨구'로 나타난다. 몽골어권의 칼카어 '툴게'에 대응한다. 튀르크어권의 여러 언어에선 '파도' 혹은 '파도가 치다' 같은 의미로 쓴다. 국어에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이 도랑의 의미를 갖는다. 이 渠(거)라는 한자는 도랑이라는 뜻 외에 개천의 뜻으로도 썼다. 광주본 천자문에는 '개천 거'로 나온다. '돈대', '돈도', '돈돌', '돈두'에서 보이는 '대', '도', '돌', '두' 등은 모두 물 특히 흐르는 물을 지시한다. 이 네 개 중 '돌'만이 음을 그대로 표기한 음독자가 된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돈두미오름 혹은 돈두악 등으로 부르는 이 오름을 고대인들은 '탄달미'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돈대미란 어원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 작은 오름이란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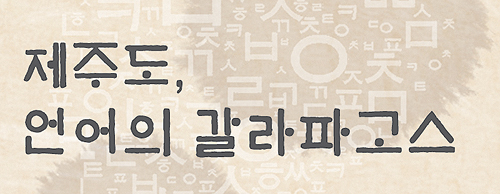



评论
发表评论